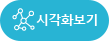| 항목 ID | GC05201677 |
|---|---|
| 이칭/별칭 | 파래질 소리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집필자 | 권현주 |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0년 - 「뜨레질」 『의성의 민요』에 수록 |
|---|---|
| 가창권역 | 「뜨레질」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
| 성격 | 노동요|농업 노동요|파래질 소리|맞두레질 소리|뜨레질 |
| 기능 구분 | 노동요 |
| 형식 구분 | 멕받 형식 |
| 박자 구조 | 2음보 |
| 가창자/시연자 | 김태식 |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5리와 안계면 용기 5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동요.
[개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가뭄에 논에다 물을 퍼 넣을 때, 용두레 대신에 맞두레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두레 양쪽에다 긴 줄을 달아 2인이 갈라서 쥐고 마주서서 하는 물푸기 작업을 노래한 것이다.
[채록/수집 상황]
「뜨레질」은 김태식[남, 1932년생, 정안 5리 출생]가 부른 노래이다. 의성군에 전하는 노동요로 2000년 의성 문화원에서 발행한 『의성의 민요』 192쪽에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구성 및 형식]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 5리와 안계면 용기 5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뜨레질」은 멕받 형식을 띄고 있으며 받음구는 “오호호 타래요”라고 노래한다. 메김구의 경우 2음보 형식을 띄고 있다.
[내용]
[메]
오호호타래요.
[메]
이논배미 물을퍼서/ 이물한바가치 퍼가지고/ 이논배미 서마지기/ 물을퍼서 모를심고.
[메]
이 그나락을 키운후에.
[메]
나락열매 맺인후에/ 〈낫으〉로다 베인후에/ 이줄저줄 씌운후에/ 마른데로 시러다가// 탈곡하야 지은후에/ 방아깐에 찧은후에/ 나많고도 불쌍한님/ 우리부모 모셔다가 // 흰쌀밥을 짓잤더니/ 모지고도 모진사람/ 왜놈에게 다뺐겼네/ 오호 타래요.
[현황]
가뭄에 맞두레를 사용하여 물을 퍼 넣으면서 부르던 노래이므로, 농업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맞두레가 사라지면서 「뜨레질」을 거의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농업요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뜨레질」은 노동요이며 농업 노동요에 속한다. 지금은 양수기 등의 사용으로 맞두레질을 많이 하지 않지만, 「뜨레질」을 기억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남성들 사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 김진순, 『한국 농업 노동요의 분류와 분포』(한국 구비 문학회, 1997)
- 『의성의 민요』 (의성 문화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