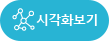| 항목 ID | GC40020521 |
|---|---|
| 한자 | 仁川蔡氏 |
| 영어공식명칭 | Incheon Chaeclan |
| 분야 | 성씨·인물/성씨·세거지 |
| 유형 | 성씨/성씨 |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황동권 |
| 본관 | 인천 - 인천광역시 |
|---|---|
| 입향지 | 인천채씨 입향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 세거|집성지 | 인천채씨 집성지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 성씨 시조 | 채선무 |
| 입향 시조 | 채영 |
고려시대 동지추밀원사를 지낸 채선무를 시조로 하고, 채영을 입향조로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에 세거한 성씨.
인천채씨는 고려 때 동지추밀원사를 지낸 시조 채선무(蔡先茂)의 후손들이 인천에 세거하면서 채씨일문을 이루었다. 고려 말에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지내다가 조선이 개국되자 절개를 지켜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서 은거한 채귀하(蔡貴河)를 중조(中祖)로 하는데,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의 인천채씨는 채귀하의 후손들이다.
인천채씨는 고려 때 동지추밀원사를 지낸 시조 채선무(蔡先茂)를 시조로 하며, 여말선초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켜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서 은거한 채귀하(蔡貴河)를 중시조로 한다. 채귀하의 아들 채영(蔡泳)은 대구 후동(後洞), [지금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에서 태어났다. 진사로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부친의 명에 따라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출사하지 않고 대구시 팔공산 자락 미대동에 입향하였다.
채영이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에 입향한 이후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많은 명현을 배출하고 대구·경북 인천채씨의 맥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 송담(松潭) 채응린(蔡應麟)[1529~1584)과 채응린의 아들인 양전헌(兩傳軒) 채선견(蔡先見)[1574~1644) 및 금탄(琴灘) 채선길(蔡先吉)[1569~1646], 투암(投巖) 채몽연(蔡夢硯)[1561~1638]과 그의 아들 백포(柏浦) 채무(蔡楙)[1588~1670], 19세기 말 효자로 이름난 치헌(痴軒) 채귀해(蔡龜海)[1850~1905], 19세기 문인 학자 미피거사(渼陂居士) 채화국(蔡華國)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일제가 1930년에 우리나라 성씨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 미대동 인천채씨는 약 74가구 정도가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화되면서 집성촌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
인천채씨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소암서원(嘯巖書院),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의현사(義峴祠),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에 있는 성재서당(盛才書堂)[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등이 있다.
- 신흠, 「조봉대부군자소감채공묘갈명(朝奉大夫軍資少監蔡公墓碣銘)」(『상촌고(象村稿)』, )
- 차장섭, 「대구의 성씨」(『조선시대 대구 사람들의 삶』, 조선사연구회, 2002)
- 「‘두문불출(杜門不出)’두문동 72현(賢)을 찾아서3 | 인천 채씨와 다의당 채귀하」 (『주간동아』, 2005. 10. 24.)